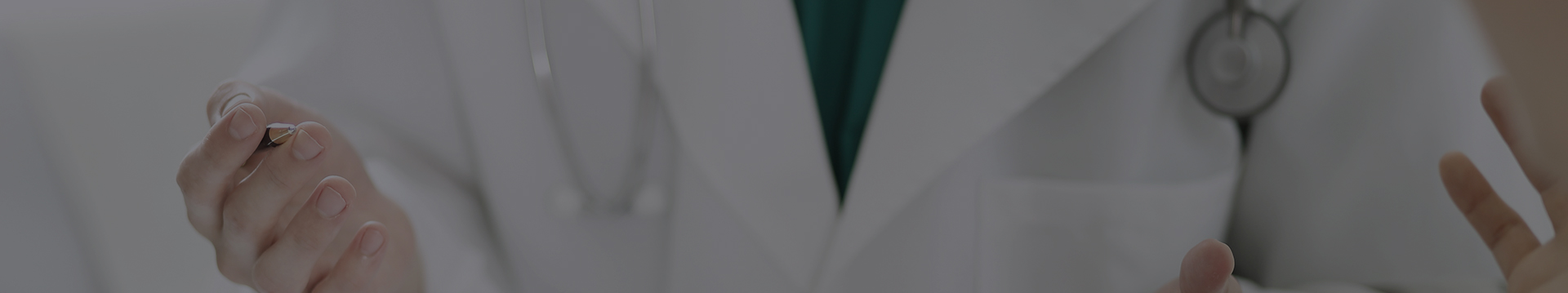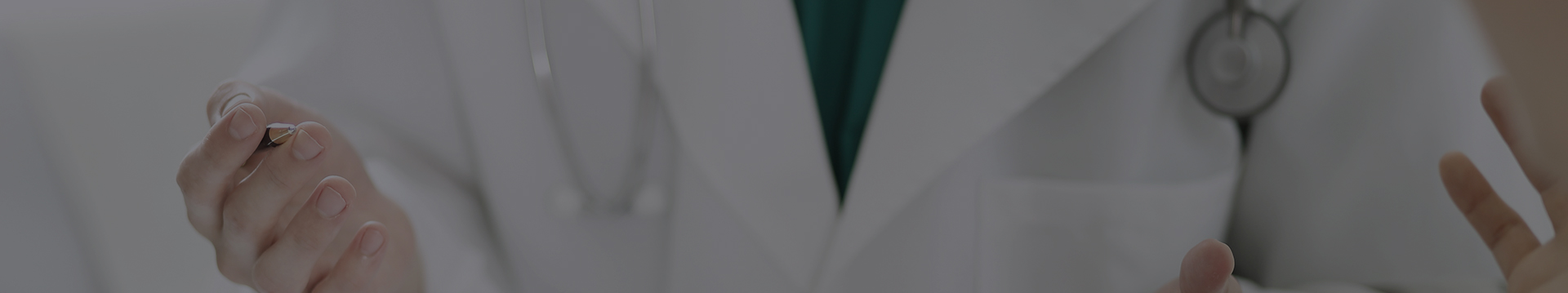상상하는 모든 것을 이룰수 있는 대학
학생중심의 민주주의대학 상지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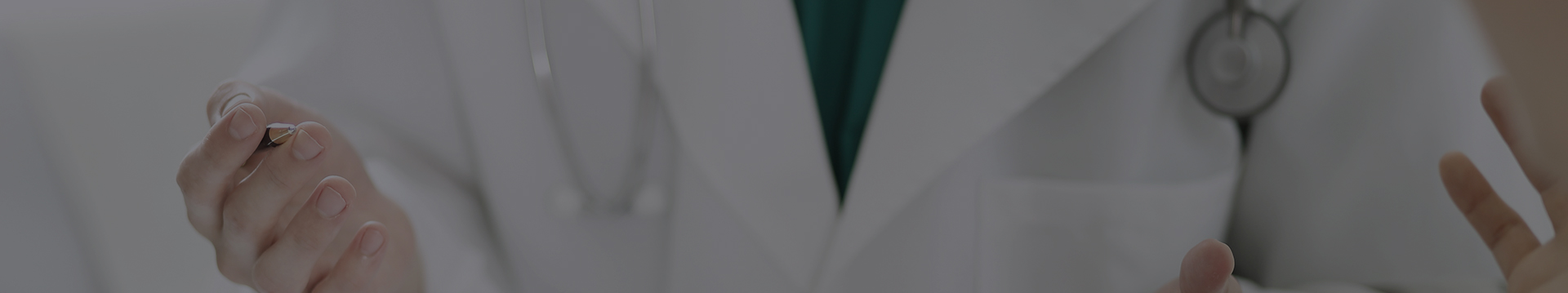
세계 작업치료의 날, 2025 테마 Occupational Therapy in Action
- 작성자정중우
- 조회수9
-
세계작업치료사연맹은 최근 ‘세계 작업치료의 날(10월27일, World Occupational Therapy Day)을 기념해 2025년 테마 “Occupational Therapy in Action”를 발표했다.
‘세계 작업치료의 날’은 2010년 세계작업치료사연맹(WFOT: World Federation of Occupational Therapists) 이 설립되던 해에 제정됐다. 이날은 작업치료 전문가들의 활동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그 사회적 가치를 널리 기념하기 위한 날로 자리잡았다.
올해의 주제인 “Occupational Therapy in Action”에는 세계 각국의 작업치료사들이 '사람들이 의미 있는 활동과 사회 참여로 나아가도록 돕는' 적극적인 실천에 초점을 맞춘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WFOT는 “사람들이 희망하고, 필요로 하며, 기대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작업치료가 건강과 행복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WFOT는 올해 세계 작업치료의 날을 맞아, 작업치료의 가치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공식 웹사이트에서 로고 데이터 및 모티프 일러스트 등 홍보용 자료를 무료 공개하고 있다.
또한 일본작업치료사협회(JAOT) 홈페이지에서도 일본어판 로고 데이터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이번 주제의 일러스트는 다양한 작업 장면을 한 붓으로 그린 다채로운 색채의 디자인으로, “각 개인에게 의미 있는 작업을 함께 수행해 나가는 작업치료사의 역할”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2025년에는 WFOT가 새롭게 개정한 ‘작업치료의 정의(Definition of Occupational Therapy)’가 공식 발표됐다. 이번 개정에서는 기존 정의보다 대상자 중심의 ‘의미 있는 작업치료 참여’를 한층 더 강조하고 있다.
WFOT의 새 정의는 “작업치료는 사람들이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자신이 하고 싶거나, 해야 하거나, 기대받는 의미 있는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적 실천”이다.
세계 작업치료의 날을 맞아 새롭게 제시된 정의와 함께 작업치료가 개인의 삶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재활뉴스(https://www.rehabnews.net)
초고령사회 필수 '작업치료' 인력 부족 심각
- 작성자정중우
- 조회수24
-
병원-지역사회 재활 활성화에 법제도 정비 시급 , 협회장 “재활은 선택 아닌 권리”
통계청에 따르면 초고령사회인 우리나라는 올 현재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이다. 앞으로 5년 후 4명 중 1명이 노인이 된다. 15년 후에는 3명 중 1명이 노인이 된다. 현재 1000만명 노인은 25년 후 2000만명 시대가 될 전망이다. 지금 의료-돌봄 수준을 고려하면 노인인구의 증가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질병 후유증으로 인한 장애 계층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정부와 지자체는 노인 장애인 등 의료-요양 등 통합돌봄 지원사업을 준비 중이다. 관련해서 노인은 질병 혹은 신체 손상, 노쇠 등으로 일상 신체·정신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의료기관 안팎에서 치료와 회복을 위해 혹은 기능 저하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작업치료’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여러 국가의 돌봄·재활 정책에서도 작업치료의 가치는 이미 경험적으로 입증됐다. 2017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단순한 치료를 넘어 지역사회 속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적인 수단으로 재활을 정의하고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하는 필수 보건 서비스라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작업치료가 아직 활성화되지 못해 필요한 노인과 환자들의 신체정신적 기능 회복을 각자 알아서 혹은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15일 서울 여의도 대한작업치료사협회에서 이지은 협회장에게 ‘작업치료 활성화’ 등 현안에 대해 물었다.
노인인구 증가로 신체정신적 기능 회복이 필요한 수요층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 안팎에서 재활서비스를 담당하는 작업치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지은 대한작업치료사협회장은 “질병이나 사고, 노쇠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이 생겨도 충분한 재활을 통해 다시 사회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며 “작업치료는 의료-돌봄 분야에서 도움이 필요한 노인 등에게 삶의 활기를 되살리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대한작업치료사협회장(2018.10~현재)은 연세대 보건과학대 재활학과 졸업/강원대 보건의료대학원 응급의료재활학과 수료/예은병원 치료부장/세브란스병원 재활병원 작업치료팀장/(현)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 대외협력이사/(현)극동대 작업치료학과 겸임교수 사진 이의종
●작업치료사는 의료기관 내 역할은
작업치료사는 의료기관에서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 외상성 손상, 발달 지연 아동 등 매우 다양한 환자의 회복을 돕는다. 단순히 팔·다리를 움직이는 운동기능 훈련을 넘어서서 직접 생활 속에서 필요한 기능을 되찾도록 한다.
예를 들면 젊은 사람이 교통사고 후 오른손을 쓰기 어렵게 되었다면, 단순 관절운동과 근력 운동뿐 아니라 글씨를 쓰거나 컴퓨터를 다루는 훈련까지 함께 해야 일상과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다. 또 고령자가 뇌졸중 후 젓가락을 쥐기 어렵다면, 손기능 훈련과 보조도구 사용을 동시에 적용하여 다시 스스로 식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작업치료사의 역할이다. 또한 정신건강과 관련한 의료기관에서는 우울이나 트라우마, 치매 환자의 인지기능 촉진 및 사회참여를 증진시키는 재활훈련을 담당하고 있다.
●의료·요양 돌봄통합지원 사업에서 활동은
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은 의료·요양·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대상자의 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과정에서 작업치료사는 개인의 신체적 기능뿐 아니라 실제 생활환경 속에서의 수행능력을 평가하고 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병원에서 퇴원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하려면, 단순히 약을 잘 챙겨 먹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집 안에서 화장실을 어떻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지, 주방에서 다시 요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낙상을 막는 환경 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생활 전반을 살피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때 작업치료사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와 협력해 환자에게 필요한 일상생활 동작과 상황을 평가하고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최대한 독립적이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생활기능 훈련과 환경개조, 보조기기 사용 교육 등을 진행한다. 이런 결과 불필요한 재입원을 줄이고 의료비도 절감할 수 있다.
●국정과제 중 ‘지역사회 재활 강화’가 있다.
정부가 지역사회 재활 강화를 국정 과제로 삼은 것은 매우 중요한 방향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선 제도적으로 작업치료사를 비롯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 지역 현장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현행 제도는 작업치료사를 병원 내에서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으로 제한하고 있어 지역사회 방문재활이나 주거환경 기반 서비스를 위해 제도권 안에서 활동하기 어렵다. 일본의 경우는 지역포괄케어 시스템 안에 작업치료사와 같은 재활 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돼 고령자의 자립 지원을 책임진다. 또 재활서비스 수가체계 마련과 전문인력 양성, 숙련된 작업치료사를 확보하기 위한 교육지원이 필요하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재활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하다. 고령화로 재활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대상자가 생활하는 현장에 접근 가능한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와 디지털 재활기기를 적극 활용해 시·공간적 제약을 줄이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노인과 고령장애인 증가로 작업치료사 부족이 예상된다.
통계청은 2035년 인구 30% 이상이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 등 만성질환 환자 증가는 재활 필요 인구 증가로 이어진다. 이를 지원할 재활인력이 부족해 질 것이라는 점은 여러 연구에서 경고하고 있다.
협업하는 물리치료사와 비교해 보면 최근 3년간 연평균 신규 면허 취득자는 물리치료사가 약 3647명인 데 비해 작업치료사는 1553명이다. 일본의 경우 2023년 전체 작업치료사 수는 약 10만명이 넘는다. 인구 10만명당 약 80명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약 38명에 불과하다. 세계작업치료사연맹(WFOT)과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권고치인 75명에 절반 규모이다.
현재 국내 작업치료사 활동 인력은 대부분 병원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2025년 대한작업치료사협회 회원정보에 따르면 전체 작업치료사 중 47%가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집중돼 활동하고 있다.하지만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히 작업치료사 인력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전체 보건의료 전달체계 안에서 작업치료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건의료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낮은 보상과 처우 격차로 숙련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데
작업치료사의 법적 업무범위는 신체·정신·사회적 기능 회복 전반을 포함한다. 하지만 현행 수가 체계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인지재활, 상지 보조기기 제작 및 훈련, 운전재활 훈련, 직업재활 훈련 등은 대부분 비급여로 운영되거나 산재보험 대상자에게만 치료가 가능하다.
보험 적용되는 작업치료들은 그 비용이 너무 낮아 대부분 병원에서는 숙련된 고연차 치료사 보다는 저연차 치료사 고용을 선호하게 만든다. 실제 2022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병원에서 근무하는 작업치료사 중 약 54.3%가 20대 여성이었다. 또한 작업치료사 약 76%가 여성임에도 남성과 여성 작업치료사간 임금격차가 존재한다. 그 격차는 연평균 3.2% 증가하는 것도 문제다.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작업치료사들이 의료현장을 떠나도록 하는 원인이 된다. 장기적인 사회적 가치와 기여도를 반영한 보건의료 보상체계의 재설계가 없이 낮은 임금과 불균형한 처우가 지속된다면 젊은 세대가 작업치료사 직종에 진입하거나 오래 종사하기 어렵게 된다. 단순히 한 직종의 문제라기보다 국가 전체가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약점이 될 수밖에 없다.
●재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환자에게 작업치료사는 단순한 운동이나 인지훈련을 지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훈련 전문가다. 특히 인지기능이 저하된 환자에게는 사회적 상호작용 기술과 기능적 인지 수준이 유지되도록 하는 작업치료 뿐만 아니라 가족 교육을 함께 진행해 돌봄 부담을 줄인다. 실제 서울시 치매안심센터와 일부 지자체는 작업치료사 개입 후 일상생활 기능 향상, 낙상률 감소, 재입원율 감소 등의 성과가 보고되고 있다.
중증 재활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재활의료기관 뿐 아니라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를 돌보는 지역사회 내에서도 활발하게 작업치료사의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하다. 첫째, 작업치료사가 참여하는 지역사회 중심 방문재활서비스를 제도화해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둘째, 돌봄과 의료를 잇는 역할을 하는 작업치료사 역할을 관련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가와 보상체계를 현실화해 작업치료사와 같은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현장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활은 선택이 아니라 권리다. 대한작업치료사협회는 포괄적 재활이 국민 누구에게나 제 때 제공될 수 있도록 함께하고 법·제도를 보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통합돌봄지원서비스에서 작업치료사의 역할
- 작성자정중우
- 조회수14
-
고령화로 인해 복합 만성질환자와 신체기능 제한을 가진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의료비와 돌봄 부담 심화, 일부 지역에서 인구소멸이라는 구조적 문제까지 나타나고 있다. 실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치매노인의 가족 중 약 45.8%가 돌봄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2024년 기준 1인 가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36.1%로, 2000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가족 내 돌봄 기능이 구조적으로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통합돌봄에 대한 기대가 높다. 통합돌봄은 대상자가 익숙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면서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도농 복합지역의 한 작은 도시에 홀로 거주하고 있는 김 어르신은 뇌졸중 후유증으로 인한 편마비 진단을 받고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자택으로 퇴원했다. 이후 매주 수요일 오후 방문 작업치료사와 함께 개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팔과 다리 기능 회복을 위한 소도구 활용 운동, 삼킴 기능 강화를 위한 호흡 및 구강 운동, 주방에서의 식사 준비 훈련, 화장실 이용 훈련 등으로 구성돼 있다.
고령화로 신체기능 제한 인구 급증
특히 화장실 이동 시에 불안전한 걸음걸이로 인해 낙상 위험이 있어 안전 교육과 함께 집안 환경 개선이 병행됐다.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매트 설치, 목욕 의자 및 화장실 안전 손잡이 등 보조기기 설치도 작업치료사의 도움으로 이뤄졌다. 앞으로 김 어르신이 동네 노인복지관과 주간보호센터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한 손으로 발목 보조기를 착용하고 지팡이를 사용 안전하게 외출할 수 있도록 외부 활동 훈련도 계획돼 있다.
이 통합돌봄 시범사업에서 작업치료사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과 협력해 대상자의 일상생활 동작을 평가하고 대상자의 신체적·정신적 능력에 맞춰 가정과 지역사회 환경에서 가능한 한 독립적이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생활기능 훈련, 주거 환경 개조, 보조기기 사용 교육 등을 실시한다. 정기 방문을 통해 대상자 안부와 건강생활 실천을 확인하고 기능저하나 질병을 예방하며 사회적 고립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역할까지 확대한다.
이러한 지역기반 통합돌봄지원사업에서 진행되는 작업치료는 병원에서 중증재활 치료와는 다소 성격이 다르다. 단순히 인지기능이나 신체기능 향상에 그치지 않고 퇴원 후 다음 재활 단계로의 이행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실제적인 일상생활 복귀와 자립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대상자가 지역사회와 다시 연결되고 재입원을 예방하며, 자신이 사는 곳에서 지속적인 재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사회에서 작업치료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 특히 지방이나 농어촌 지역에서는 치료를 넘어 일상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작업치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활성화 수준이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재활-일상 복귀 및 자립 지원 부족한 현실
내년 3월 전국에서 시행될 통합돌봄 시범사업에서는 수요자의 상태와 욕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밀착형 지원체계가 요구된다. 통합돌봄 서비스 체계 안에서 작업치료가 핵심적인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지속 가능한 돌봄 향상을 위한 서비스의 중심에 작업치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회복기재활 건강한 삶 건보재정 절감 일석이조
- 작성자정중우
- 조회수7
-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까지 18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 진입은 6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에 도달한 독일이 36년, 프랑스 42년, 스웨덴 50년을 감안하면 정책 마련은 꿈도 못꿀 속도다. 초고령국가인 일본도 10년이 걸렸다.
이로 인해 경상의료비도 비상이 걸렸다. 1990년-2022년 OECD 38개 국가 경상의료비 평균은 약 1.4배, 1990년-2022년 사이 G7 국가 경상의료비 평균은 약 1.57배 증가한데 반해 우리나라는 1990년-2022년 사이 약 2.7배 증가했다.
따라서 초고령사회 노인건강을 위해 ’회복기재활‘이 주목받고 있다. 건강한 삶과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라는 일석이조(一石二鳥)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대한회복기재활학회(회장 김연희·이사장 우봉식)과 아이엠재활병원(병원장 우봉식)의 도움으로 주요국의 ‘고령화 대응’과 ‘회복기 재활’ 관련 정책을 살펴본다.
□영국 고령화 대응은 의료복지 개혁 ‘커뮤니티 케어’로 압축된다.
영국은 1946년 국민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과 국민건강서비스법(NHS Act), 1948년 국민산업재해법, 국민부조법(National Assistance Act) 등 제정하여, 민간 소유의 병원, 구빈원(The poor house), 장기체류형 시설 등을 국가가 인수・운영했다.
1950년대 초반 정신질환자, 고령자 등의 장기체류자 케어를 지방정부로 넘기면서 커뮤니티 기반의 서비스가 강조됐다.
1973년 석유파동에 이은 경제위기에 직면하게 되면서 영국에서 ‘복지 다원주의(welfare pluralism)’ 논쟁이 시작됐고, 그리피스(Griffiths)가 1988년 발간한 ‘커뮤니티 케어에 관한 녹서(Green Paper)’에서 ‘커뮤니티 케어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본격적으로 복지 다원주의가 추진됐다.
1990년 ‘National Health Service and Community Care Act’와 1993년 ‘Community Care Act’ 제정을 통해 지방 정부는 커뮤니티 케어 제공 조력자로 한정하고, 민간사업자나 자원봉사단체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제로 전환된다.
2011년 3만 8719 베드를 운영해 온 영국 최대 요양시설인 ‘Southern Cross’가 파산으로 영국 커뮤니티 케어는 위기를 맞는다.
2012년 ‘Health and Social Care Act’, 2014년 ‘Care Act 2014’ 등을 제정해 중앙정부의 ‘CQC(Care Quality Commission 돌봄 품질 위원회)’가 커뮤니티 케어의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모든 서비스 제공기관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지역에서 각 기관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민간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금의 커뮤니티 케어 모형이 정립된다.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 대응에 나섰기에 참고할 만한 내용이 많다.
초고령사회 진입 후 일본에서 일어난 현상은 경상의료비의 급증이다. 일본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0.3%이던 1984년 6.4%에서 고령사회에 진입한 1994년(노인인구 14.1%) 6.6%까지 10년 간 큰 변화가 없었으나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2004년에는 10년 만에 7.7%로 급증한 이후 2014년 10.8%, 2024년 11.4%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재택의료 이용 건수도 크게 늘었다. 일본은 1992년 방문진료 의료보험 적용으로 재택의료 제도가 시작돼 2000년 개호보험 제도 시행과 함께 개호보험 급여로 전환됐다.
보고된 이용 건수 데이터에 따르면 월평균 방문진료 건수는 2006년 19만 8166건에서 2019년 79만 5316건으로 4배 이상 늘어났다.
일본은 1980년대 이후 고령화와 와상 노인이 문제가 되면서 노인보건시설, 노인 데이케어가 1980년대에 먼저 신설되고, 이어서 1990년대에 방문간호스테이션, 방문재활 등이 시행되다가 2000년. 회복기재활병동 제도가 도입된다.
출처:아이엠재활병원 IM회복기재활연구원 재가공
특히,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호보험(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개호보험 적용 이전에 충분한 재활의료가 제공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2000년 4월 일본의 진료수가 개정 시 '회복기 재활제도'가 도입되면서 회복기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우선적으로 회복기 재활병원으로 가도록 하는 ‘재활전치주의(再活前置主義)’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회복기 재활제도와 함께 일본의 고령화를 떠받치고 있는 것은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이다.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은 영국의 커뮤니티 케어에 해당하는데 노인인구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해법으로 걸어서 30분 이내의 지역사회에서 의료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일본 정부는 지난 2014년 2월12일 ‘지역에서 의료 및 개호의 종합적인 확보를 추진하기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의료・개호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른 의료개혁의 핵심은 의료기관 병상을 기능에 따라 ‘고도급성기-급성기-회복기-만성기’로 구분해 명시하고 급성기나 요양 병상을 회복기 병상으로 전환하고 있다.
병상자원 관리는 도도부현(都道府県)의 지역의료계획에 따라 진료권역별로 각 지역의 필요 병상 수를 책정하는데, 이를 ‘기준병상 수’라고 한다. ‘기준병상 수 제도’의 목적은 병상 과잉 지역의 병상 신설을 억제하고 병상이 부족한 지역으로 신설을 유도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병상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일본의 의료・개호 개혁은 고도급성기·급성기·만성기 병상을 줄이고 대신 회복기 병상을 증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본은 2024년 ‘회복기 재활병동’ 입원료를 4.7% 인상했으며, 재활분야 이외 회복기 병상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포괄케어병동’ 입원료는 10.3% 인상했다.
질환별 재활치료료에서 ‘운동기 재활치료료(근골격계)’는 기존 1일 9단위에서 6단위로 축소되고, ‘구강재활영양관리’ 수가와 영양정보연계료가 신설됐다. ‘체제강화가산’은 폐지했다.
회복기 재활 병상 수는 2000년 회복기 재활치료 제도 도입 첫 해 4019병상(인구 10만명당 3.17병상)에서 3년 뒤인 2003년 1만 6802병상으로 늘었다.
2006년 3만 499병상, 2009년 5만 2756병상, 2015년 7만 4460병상, 2021년 9만 660병상, 2024년 3월 9만 8055병상(인구 10만명당 77.3병상)으로 회복기 재활 병상의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재활의료 체계를 보면, 급성기 재활은 주로 입원환자재활시설(Inpatient Rehabilitation Facilities, IRFs)에서 이뤄진다. 주된 대상은 뇌졸중, 척수 손상, 외상성 뇌손상, 다발성 외상 등 집중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며, 병원 내에 독립된 병동으로 존재하거나 별도의 재활 전문 병원 형태로 운영된다.
하루 3시간 이상의 집중적인 재활 치료를 제공하지만 고액의 치료비($2000-$5000/일)로 인해 이용이 제한적이다.
급성기 병원의 평균 입원 기간은 뇌졸중 5-6일, 척수손상 약 11일 정도다.
아급성기 재활(Post-Acute/Sub-acute Rehabilitation)을 보면, 전문 요양 시설(Skilled Nursing Facilities, SNFs)은 급성기 치료 이후 아직 집으로 돌아가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환자들이 주로 이용한다. IRFs보다는 낮은 강도의 재활치료와 함께 24시간 간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사는 환자 상태를 감독하지만 매일 방문하지는 않고, 비용은 총액 기준 하루 $400-$850 정도다.
장기 요양 병원(Long-Term Acute Care Hospitals, LTACHs)은 중증의 복합적인 의학적 문제를 가진 환자들 가운데 장기간(보통 25일 이상) 병원 수준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입원한다. 집중 재활치료보다는 의학적 관리와 함께 저강도의 재활 병행. 의사가 매일 방문 진료한다.
재가 의료(Home Health Care)는 환자가 퇴원해 집으로 돌아간 후, 간호사나 치료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독일의 재활의료 체계는 ‘급성기→회복기→만성기’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
신경계 재활의 '단계 모델(Phasenmodell)은 ▲‘Phase A(Akutbehandlung, 아쿠트베한틀룽)’의 경우 급성기 치료 단계. 중환자실 등에서 생명을 구하는 치료가 이루어지는 단계다. ▲Phase B(Frührehabilitation, 프뤼리하빌리타치온)는 ‘전문재활 클리닉’(Reha-Klinik)으로 가기 전 ‘조기 재활’ 단계. 근육 위축, 관절 구축, 폐렴, 욕창 등 2차 합병증 예방 목적으로 시행한다. ▲Phase C(Weiterführende Rehabilitation, 바이터퓌어렌더)는 환자가 의학적으로 안정돼 하루 몇 시간씩 적극적인 재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단계. 주로 전문 재활 클리닉(Reha-Klinik)에서 이뤄진다. 일본의 회복기 재활에 해당한다.
▲Phase D(Anschlussheilbehandlung, 안스루스하일베한틀룽)은 지역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후속 재활 단계. 외래 재활이나 통원 치료를 할 수 있다. ▲Phase E(Nachsorge und berufliche Reintegration)는 사회・직업 복귀 지원이 가능하다.
아급성기 재활(레하클리닉:Rehaklinik)은 ‘요양보다 재활(Rehabilitation vor Pflege)’이 원칙이다. 사회보험을 통한 강력한 재활 지원, 직업 재활 및 사회복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입원 대상은 정형계(척추 수술, 인공관절 치환술, 골절, 만성 통증 증후군 등), 신경계(뇌졸중, 회상성 뇌손상, 척수손상, 파킨슨병, 다발성 경화증 등), 심혈관계(심근경색, 심장 수술 후, 만성 심부전 등), 정신과 및 심신의학(우울증, 불안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번아웃 증후군, 섭식 장애 등) 등이 있으며, 입원기간은 정형계 또는 내과계 3주 내외, 신경계 최대 180일까지 입원 치료가 가능하며, 의사 소견서로 연장이 가능하다.
퇴원 이후 재활치료는 외래 재활(Ambulante Rehabilitation)을 통해 주 3-5일, 하루 4-6시간 치료하며, 기능훈련 프로그램(IRENA)은 주 1-2회, 물리치료, 작업치료로 구성돼 있다. 가정간호 및 방문 재활,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자조 모임 등에 참여 가능하다.
재활치료비는 일당 정액제를 적용한다. 입원 재활 본인부담금은 하루 10유로, 연간 최대 28일까지만 부담한다.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해 연 소득의 2%(만성 질환자는 1%)를 넘지 않도록 히고 있다. 도덕적 해이 방지 대책으로 치료의 시작·연장·종결권을 환자가 아닌 의사가 가지게 되며, 의사 소견서가 필수다.
의료 서비스 감독기구(Medizinischer Dienst der Krankenversicherung, MDK)에서 의학적 심사・평가 후 진료비를 지급한다.
□2018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프랑스도 독일과 비슷하게 ‘급성기→회복기→만성기’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
급성기 재활(Rééducation en phase aiguë)은 환자의 생명을 안정시키고, 추가적인 합병증(욕창, 관절 구축, 근육 위축 등)을 예방하며, 최대한 이른 시기에 환자의 신체적, 인지적 기능 평가를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학병원(CHU), 종합병원(Centre Hospitalier)의 집중치료실(ICU)이나 병동 등에서 이뤄진다.
회복기 재활(Soins de Suite et de Réadaptation, SSR)의 공식 명칭은 '지속 및 재활 치료(SSR)'다. 급성기 치료를 마친 환자가 집이나 사회로 복귀하기 전, 집중적인 재활 치료를 통해 신체 기능을 최대한 회복시키는 시기로 정의하고 있다.
하루 최대 4시간 재활치료. 재활의학과 의사를 중심으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의지보조기 기사 등 여러 전문가가 팀을 이뤄 환자 한 명을 위한 개인별 맞춤 재활 프로젝트(Projet thérapeutique personnalisé)를 수립하고 실행하는 다학제적 팀 접근(Équipe pluridisciplinaire) 방식으로 이뤄진다.
평균 입원 기간은 약 35일 전후며, '기능 회복'과 '일상생활로의 복귀' 라는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있다.
입원비는 크게 급여 항목(건강보험 적용), 비급여 항목(전액 본인 부담), 간병비로 나뉘는데, 급여 항목 본인부담률은 총 진료비의 20%(단, 식대는 50% 부담)다. 비급여 항목은 상급병실료, 선택적 치료(로봇, 도수치료 등), 각종 증명서 발급 등이다.
간병비는 하루 12-15만원 선. 공동 간병도 있으나 소수다.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2025년 기준 80-826만원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10개 구간으로 나뉜다.
만성기 재활(Suivi en phase chronique / Réadaptation à long terme)은 SSR을 통한 집중 치료가 끝난 후에도 영구적인 장애나 만성적인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기능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단계다.
치료(Soins)보다는 돌봄(Prise en charge)의 개념이 강해지며, 의료기관과 사회복지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한다.
지역 의원(Cabinet de kinésithérapie libéral), 외래 재활 센터, 주간보호센터, 장기요양시설(EHPAD), 장애인 지원 시설 등 매우 다양한 곳에서 이뤄진다.
기능 유지 및 악화 방지, 만성 통증 관리, 보조기구 활용 및 환경 적응, 사회 활동 참여 지원. 병원 중심이 아닌 지역사회(Community)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호주의 재활의료 시스템은 1-4단계로 구성돼 있다.
1단계는 급성기 병원(Acute Hospital)은 뇌졸중 유닛(Stroke Unit)이나 중환자실(ICU)에서 신경과 또는 신경외과적 시술 또는 수술 후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재활팀 개입은 상태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합병증 예방을 위한 초기 재활(침상에서의 관절 운동 등)을 시작한다.
2단계는 입원 재활 전문병원/병동(Inpatient Rehabilitation)에서 핵심 집중 재활을 한다.
환자의 상태가 의학적으로 안정된 후 본격적인 기능 회복을 위한 재활을 하며, 주로 재활 전문병원 (Rehabilitation Hospital)이나 재활병동(Rehabilitation Ward, IRFs)에서 시행한다.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주도하에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재활 전문 간호사, 심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하나의 팀을 이루어 환자 한 명을 위한 통합 치료 계획을 세운다.
매일 최소 3시간 이상의 강도 높은 1:1 맞춤 재활 치료, 일상생활 복귀에 초점을 두어 고강도 집중 훈련을 한다. 기간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수 주에서 수개월까지 입원한다. 재원은 공립 재활병원(20%)은 메디케어, 사립 재활병원(80%)은 사보험으로 충당한다.
3단계는 외래 및 지역사회 재활 (Outpatient & Community Rehabilitation)로 퇴원 이후 지역사회에서 재활을 받게 된다. 병원 외래 재활 센터, 지역사회 건강 센터 (Community Health Centre), 가정 방문 재활 (Home-based Rehab) 등이 있다.
4단계는 국가장애보험제도 (NDIS)로 장기적인 삶의 질 관리를 목표로 한다.
재활치료가 끝난 후에도 영구적인 장애가 남은 경우 NDIS(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를 통해 장기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미국과 호주는 일본과 같은 회복기 재활의료 제도가 없는데 이는 고령화 정도가 일본보다 늦어 회복기 재활 수요가 아직은 많지 않기 때문으로 학회는 분석하고 있다.
출처 : 재활뉴스(https://www.rehabnews.net)
복지부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에 역량 집중
- 작성자정중우
- 조회수2
-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를 출범해 부처 역량을 집중한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11일 제1차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 회의를 열어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및 방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의료‧요양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 중심으로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4년 3월 26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법(돌봄통합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 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통합돌봄은 통합판정조사 통해 필요도 조사(건보공단 수행, 퇴원환자 등 긴급사례나 지역돌봄 중심사례는 지자체 직접 조사)를 한 뒤 통합판정조사 등을 바탕으로 지자체가 통합돌봄 필요도와 지원방향을 판단해 통합지원하게 된다.
통합지원은 보건의료(재택의료, 재택간호, 복약, 만성질환관리, 가정형 호스피스, 요양병원, 치매안심센터 등) 서비스를 포함해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가족지원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총망라한다.
보건복지부는 장관을 단장으로 하고, 제1차관 및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보건의료정책실장, 노인정책관, 복지행정지원관, 장애인정책국장, 사회서비스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장, 건강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관 등 소관 실·국장이 참여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를 구성했다.
추진본부는 기존에 운영 중이던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추진단(단장 제1차관)’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이는 노인‧장애인 등 대상자별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의료를 포괄하는 돌봄 인프라 및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는 추진 구조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범사업 운영 현황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며 통합돌봄 전국 시행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과 추진방향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통합돌봄 체계 안에서 필요한 의료적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다. 통합돌봄 시범사업은 2023년 7월부터 시작해 131개 지자체가 참여 중이다.
시범사업 지자체의 통합돌봄 대상자는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입소 경계선상에 있는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노인맞춤돌봄 중점돌봄군 및 장기요양등급외자, 장기요양 등급판정 대기·불인정에 따른 일시적 돌봄 필요자, 퇴원환자, 고령장애인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추진본부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본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요양, 보건의료 등 다양한 서비스와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출처 : 의료&복지뉴스(http://www.mediwelfare.com)
정신건강을 위해 작업치료를 더하다(개정판)
- 작성자정중우
- 조회수7
-
작업치료의 본질과 가능성을 파고든 책이 나왔다. ‘정신건강을 위해 작업치료를 더하다’는 정신과 현장에서 일하는 작업치료사 세 명이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한 현실 밀착형 기록이다.
이 책은 작업치료사를 위한 실천서로, 병원과 아동센터, 치매안심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서 활동 중인 작업치료사의 역할을 조명한다. 특히 정신과 환경에서 일하는 작업치료사는 1% 미만에 불과한 상황에서, 저자들은 낯설지만 중요한 이 분야의 이야기를 자신들의 시행착오와 성찰을 통해 생생하게 전한다. 작업치료를 준비하는 학생뿐 아니라 작업치료의 개념이 낯선 일반인에게도 좋은 입문서가 될 수 있다.
책은 ‘작업’이란 개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한다. 단순히 물리적인 활동이 아닌, 개인의 삶과 연결된 의미 있는 활동이 치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점을 강조하며, 환자의 삶에 깊이 관여하는 ‘작업의 가치’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풀어낸다. 클라이언트가 질병과 공존하며 의미 있는 작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작업치료사의 역할임을 힘 있게 제시한다.
중독 치료에 대한 장도 인상적이다. 중독자를 단순히 질병 환자가 아닌, 회복 가능한 주체로 바라보며 집단 치료 현장에서의 감동적 장면들을 소개한다. 중독이 결핍과 고립에서 비롯된다는 관점을 바탕으로, 사회적 연대와 작업 참여를 통해 회복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저자 중 한 명은 국립법무병원에서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법무부 공무원으로서 재범 예방에도 기여하고 있다.
작업치료의 전문성과 윤리를 강조하는 대목도 주목할 만하다. 현장에서 느낀 시스템의 한계와 협력 체계의 부재를 지적하면서, 실질적인 ‘연습’과 ‘반복’, 그리고 환자 삶에 진심으로 개입하는 태도야말로 진정한 전문가를 만든다고 말한다. 자격이나 이론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애정과 실천이 핵심임을 강조한다.
‘정신건강을 위해 작업치료를 더하다’는 단순한 경험담을 넘어, 작업치료가 정신건강의 중요한 축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역설한다. 정신질환자, 중독자,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실천은 앞으로 더 많은 작업치료사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 이 책은 그들의 길잡이가 되어줄 현실적인 안내서이자, 작업의 의미를 다시 묻는 이들에게 보내는 따뜻한 응원이다.
출처 : 의사신문(http://www.doctorstimes.com)
장애인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55.3퍼센트로 증가
- 작성자정중우
- 조회수4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7일 2024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수는 2024년 말 기준 총 263만1356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5.1%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번 통계는 국가승인통계 제117061호인 '연도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로, 매년 4월 발표된다.
전체 등록장애인 수는 지난해 말(263만3262명)보다 1906명 감소했으며, 15개 장애유형별 비중은 지체장애(43.0%), 청각(16.8%), 시각(9.4%), 뇌병변(8.9%), 지적장애(8.9%) 순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고령 장애인의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65세 이상 등록장애인은 전체의 55.3%(145만5782명)를 차지했으며, 연령대별로는 60대가 23.6%(62만1450명)로 가장 많았고, 70대(22.0%), 80대(17.5%) 순이었다.
2024년 한 해 동안 새롭게 등록된 장애인은 8만5947명이었다. 새로 등록된 장애인 중 가장 많은 장애유형은 청각(31.7%), 다음은 지체(16.6%), 뇌병변(15.8%), 신장(11.1%)순이었다.
등록장애인 중 심한 장애인은 96만6428명(36.7%),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66만4928명(63.3%)이고, 남성 장애인은 152만5056명(58.0%), 여성 장애인은 110만6300명(42.0%)이었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의 영향으로 등록장애인 수의 감소와 65세 이상 장애인 비율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면서 “등록장애인의 현황 변화 추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합한 장애인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한의신문(https://www.akomnews.com)
전국 131개 지자체, 의료, 요양, 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참여
- 작성자정중우
- 조회수8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5년 제2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31개 시·군·구를 신규 시범사업 자치단체로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31곳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이는 전체 자치단체의 약 57.2%에 해당한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앞서,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돌봄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실질적인 운영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다.
이번 2차 공모에서는 자치단체의 사업 추진 의지, 계획의 타당성, 지역 특성, 광역-기초 협업 방안 등을 종합 평가해 대상지를 선정했으며, 신규 참여 자치단체는 서울 용산구·강북구·강서구·송파구, 부산 해운대구·동구·서구·강서구, 경기 고양시·화성시 등 전국 각지에 고르게 분포돼 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부평구와 계양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2차 공모에서는 추가 선정된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오는 6월부터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7월부터는 각 지자체가 전담조직을 구성해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통합돌봄 서비스를 마련하고, 내년 3월 본사업의 전국 시행을 위한 기반을 다진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전국 시군구의 절반 이상이 시범사업에 참여함으로써 통합돌봄 제도의 전국 확산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지원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미디어생활(https://www.imedialife.co.kr)